
[미디어한국] 며칠이었는지,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.
인생 마지막 버킷리스트 가운데
가장 핵심이라 여기는 원고를 정리하다가
어느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늪에 빠져버렸다.
그 늪은 물기가 흐물흐물한 진흙 펄이 아니다.
어디가 바닥인지, 어디가 출구인지도 구분되지 않는
머리와 마음의 깊은 흡입구 같은 것이었다.
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,
빠져나올수록
더 깊은 어둠이 펼쳐지는 이상한 공간이었다.
그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
나는 사실상 책상 앞에서만 살았다.
배고프면 대충 먹고,
졸리면 그대로 엎드려 잤다.
시간 감각도 사라졌고
날마다 하던 샤워조차 하지 않았다.
아침이면 세수하는 것도 잊어버렸다.
그저 글의 한 구절, 한 문장, 한 개념을 붙들고
끝 모를 미로 속을 배회했다.
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
언젠가는 빠져나올 줄 알았다.
그게 진리의 길이고, 깨달음의 길이며,
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기 때문이다.
그러나 늙어서 맞닥뜨린 그 늪은
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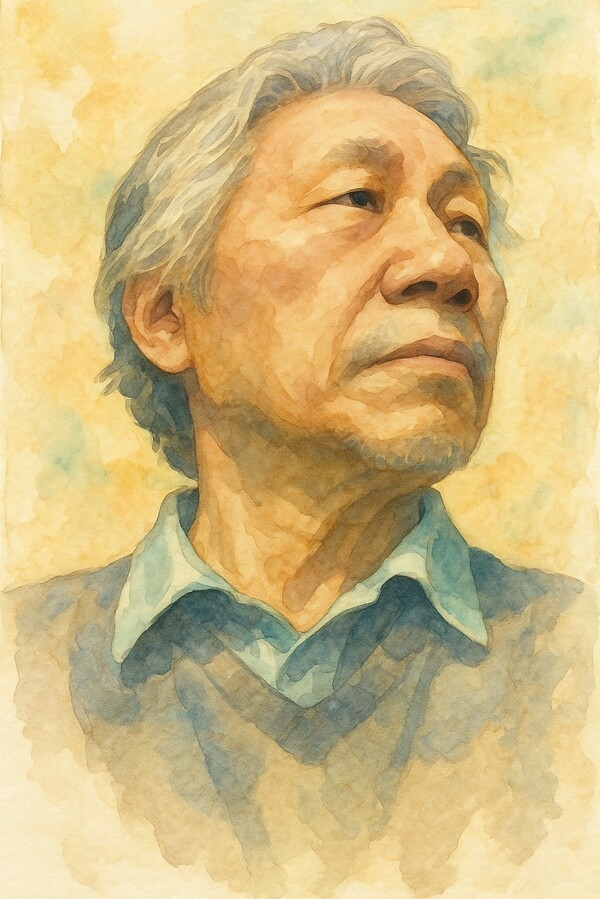
그리고 오늘 오전, 나는 마침내 늪을 건넜다.
늪 가에 앉아 잠시 안도하는 순간,
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놀랐다.
내가 보아도
저게 과연 사람인가 싶은 몰골이었다.
얼굴은 무너져 있었고,
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.
나 스스로 놀라
부랴부랴 샤워하고
수염도 깎았다.
그리고 오거리 청자다방에 가서
커피 한 잔을 사 들고 와 창가에 앉았다.
그동안 나를 짓누르던 찌든 땀 냄새 대신
갓 내린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우고,
창밖 뜰에 핀 국화꽃이 보였다.
그 국화꽃을 보는 순간
비로소 내가 다시 사람 사는 세상으로
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.
그런 잠시,
“지랄 ― 너도 참 지랄이다.”
내가 나에게 한 소리다.
이건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병이다.
내 사는 일이 병이다.
무엇인가에 몰입하면
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는
나의 오래된 병이다.
젊을 때는 체력이라는 방패가 있었다.
밤을 새워도, 이틀을 굶어도 몸이 버텨주었다.
그러나 나이는 그 방패를 하나둘 벗겨내고
이제는 작은 늪에도 전신이 잠겨버린다.
그 속에서 나는 매번 허우적거린다.
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,
고쳐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
불치의 병이다.
사람이 산다는 것
이게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
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.
내가 나를 알고
내가 사는 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 ―
이 단순한 말이
살면 살수록 가장 어렵다.
가장 힘들고,
가장 깊은 삶의 공부가 된다.
글이라는 것,
지리산이라는 것,
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,
지금 내가 쓰는 이 원고라는 것도
결국은 늪을 건너는 일이다.
그리고 그 늪을 건너는 동안
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안다.
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
나는 또 깨닫는다.
내가 참 단순한 짐승이라는 것을
창밖 국화꽃 한 송이가
나를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 되돌려 놓았듯이,
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 다시 살아난다.
한 줄기 바람에서,
한 모금 커피에서,
한 송이 꽃에서,
그리고
문득 나를 돌아보는 한순간에서.
사는 일은 병이지만,
그 병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.
늪을 건너며
나는 나를 다시 보았고,
그 일을 통해
또 한 번 사람으로 돌아온 늦가을 오후
창밖 뜰에 핀
붉은 국화꽃이 아름답다.
- [정치] 전국소상공인정책포럼, 김용 전 부원장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
- [경제 칼럼] 라이브커머스 전성시대, 지역 프랜차이즈형 인터넷 방송국이 여는 유통의 새 질서
- [문화] 김종덕 본지 문화예술위원. 국제경쟁시경연대회에서 “Honorable Mention”수상을 해
- [속보-정치] 나경원 의원, 대장동 일당 폭망 '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' 대표발의 "8000억 도둑질 범죄수익, 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"
- [국민의 소리] Peter kim. 정성호. 깡패 두목이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?...한국은 이재멍 발 고난의 행군의 세상인데?
- [정치 현장] 김경국 TV. 美 진 커밍스. “윤석열 전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이고,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과 반발로 탄핵 가능성이 거론”
- [정치] 붕괴하는 한국. 부도로 가고 있나?...더불어 공산화의 지표들이 보여!
- [사설] 李.마지막 갈곳은 교도소 혹은 관타나모로...고히 보내드리오다
- [정치현장] 민주당 전갈 정치의 속성.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. 하나를 주고 나면 셋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. 셋을 주고 나면 다섯 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고, 다섯을 주고 나면 열 개 모두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.
- [봉성산 시론] 각심(覺心) 큰스님 영전에 바치는 헌사(獻辭)